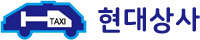무슨 일이야

카카오T블루, 뭐가 문제?
두번째 계약은 카모가 직접 가맹기사(회사)와 맺는 ‘업무제휴 계약’이다. KMS를 통해서 전달 받은 택시 운행매출의 20% 중 15~17%를 ‘업무제휴비’ 명목으로 해당 기사(회사)에 다시 준다. 택시들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카카오T블루 광고를 해주는 대가 성격이다.
이러한 ‘가맹+제휴’ 복합 계약 구조는 카모의 매출을 실제보다 커보이는 효과를 낳는다. 가령, 가맹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카모가 가맹사업으로 버는 실질 매출은 3만~5만원이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택시기사가 KMS에 로열티 명목으로 낸 20만원이 카모 매출로 잡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중계약 구조가 의도적인 ‘매출 부풀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차례 거론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3.3% 수수료만 받지 왜 굳이 20% 수수료를 받냐.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라는 의심이 있다”고 질의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수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5%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며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대답을 했다. 이듬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안규진 카모 부사장에게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가맹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카모는 이중계약 구조를 계속 고수했고, 이제는 금융감독원이 나선 상황이다. 이소영 의원은 "가맹 수수료 구조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카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은
하지만 가맹 택시기사 입장에서 업무 제휴계약을 맺지 않으면 수수료로 매출의 20%를 전액 다 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계약이 별건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카모 말대로 두 계약이 별건이라면 둘 중 가맹계약만 맺은 기사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4만여대 가맹택시 중 그런 사례는 한 곳도 없다. 경쟁사인 우티는 복잡한 계약 없이 가맹비 2.5%만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속내는
우선 상장(IPO)를 위해 매출 외형을 키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카모의 매출은 가맹택시 사업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매년 크게 성장했다. 2020년 2800억원 매출에 영업손실 129억원을 기록했던 카모는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매출은 7914억원, 영업이익은 195억원이었다. 카모는 2022년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었다. 두번째는 수수료를 올리는 것보다 업무 제휴비 조절이 유연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비를 3%에서 5%로 올리는 것보다 돌려주는 업무 제휴비를 17%에서 15%로 줄이는게 더 심리적 저항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상장만 바라보는 카카오모빌리티
민병덕 의원은 “국감에서 이러한 분식회계를 지적했는데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건 여전히 상장을 위한 외형부풀리기로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